2005/09/09
제 친구가 개략적인 감상평을 해준 것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친구는 문장력이 부족하여...
친구야 이글 보거든 연락 좀 해줘
휴가철, 음악 여행을 떠나자
요즘은 처음 음악을 접할 때부터 음질이 좋은 연주를 위주로 들어 버릇해서 녹음의 질이 낮으면 음반 구입을 일단 외면하는 음악 애호가들이 늘고 있는 듯하다. 녹음이 잘 된 음반을 신경 써서 마련한 오디오 재생기기로 재생해서 연주장의 기분을 비슷하게 재현해 보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은 남자들이 아니고는 이해하지 못할 법한 특별한 재미다. 필자 역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녹음기술이 발전해 가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같은 취미를 가진 음악 애호가들이 단지 녹음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만으로 예전의 거장들의 연주를 접해볼 기회를 잃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과거의 위대한 전통과 유산의 바탕 위에 거장들이 풀어놓는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연주세계를 엿들어 보는 것은 마치 가슴이 설레는 여행을 떠나는 것과도 같다. 때로는 덜컹대며 먼지가 풀풀 날리는 마차여행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은하철도 999 같은 우주여행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음악과 친하지 않고서는 오디오라는 것도 금방 시들해질 텐데 어디 한번 음악이 주는 재미를 맛보지 않으시려는가?
오디오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데에도 다양한 경험과 비교가 필요하듯이 곡이나 연주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연주를 비교해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곡 하나를 놓고 여러 명의 연주자가 해석하는 다원적인 가치체계를 경험해 보는 것이다. 그런 시도의 첫 순서로 피아노의 구약성서라고 일컬어지는 바흐의 클라비어 평균율을 선택했다.
평균율에 대한 이야기
클라비어 평균율은 음악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존재이자 인류문명의 발전이라는 역사 중에서도 중요한 한 토막을 차지하는 곡이지만 간략하게 내용 소개를 하기는 쉽지 않다. (곡의 과학 문명적인 의의에 관심이 있으면 죠셉 니덤이 집필한 [중국의 과학과 문명]을 참고해 볼만하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원초적인 인상을 설명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book I에서는 2 성부의 멜로디 라인이 위주여서 연주와 감상이 쉽다면 book II는 멜로디 라인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복잡하고 산만한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렇게 들리는 이유는 멜로디 라인이 3중 이상이기 때문이다. 두 손을 사용해서 3 성부 이상을 표현해야 하는 복잡성 때문에 한 순간에 모든 멜로디 라인을 보여주면서 통일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연주효과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연주자에게 취사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는 곡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연주 능력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곡이기 때문에 연주자가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연주하는 방법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서 어느 곡보다 흥미진진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곡이다.
곡의 이런 특성은 양자역학에서의 불확정성을 연상하게 만들기도 한다. 양자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 양자의 현상을 발견했을 때 어느 시간에 양자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며, 반대로 위치를 알았을 때는 그 위치에 있었던 때를 알 수 없듯이, 평균율을 화성적인 아름다움과 구조가 드러나게 연주하게 되면 멜로디의 라인이 드러나지 않게 되고, 반대로 멜로디 라인의 아름다움에 탐닉하는 연주를 하면 화성적인 아름다움과 구조가 그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복잡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선율적으로 훨씬 친근하게 들리는 book I을 우선 감상하시면 되겠다.
리뷰에 등장하는 연주 소개
이번 리뷰에는 필자가 소장한 라이브러리에서 피아노로 연주한 것만 선택적으로 골랐다. 가장 오래된 연주는 1933년도 에드윈 피셔의 연주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이는 1987년에 녹음된 키스 쟈렛의 연주까지 등장한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란도로프스카의 연주는 리뷰 대상에 들지 못했다. 그리고 솔로몬의 연주는 별로 열성을 다하지 않은 해석과 연주여서 따로 설명을 할 수도 없고 필요도 느끼지 못해서 리뷰에서 탈락시켰다.
청취는 연주자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book II를 가지고 했으며 예외로 book I을 사용한 경우는 키스 자렛의 연주뿐이었다. 그 이유는 키스 자렛의 book II는 쳄발로로 연주되었기 때문이다.
곡을 들을 때는 악보를 펴놓고 보면서 특정 연주자의 연주 스타일에 대한 영향력이나 선입견이 다른 연주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사용한 악보는 Schott/Universal edition을 기초로 했으며 Bach-Gesellschaft Edition, Henle edition은 참고용으로 사용했다.
멜로디의 아름다움에 중점을 둔 로잘린 투렉의 연주

로잘린 투렉의 연주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로맨틱하다.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기보다는 멜로디상의 프레이징의 흐름과 아티큘레이션의 아름다움에 중점을 둔 연주다.
다른 연주자의 연주에 비하면 멜로디의 흐름이 단번에 느껴진다. 악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튜렉은 전 곡에 걸쳐서 루바토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템포를 늦췄다 빠르게 했다 하면서 완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피아노시모와 포르테시모까지 진폭이 크도록 강약을 조절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19세기 피아노 전통에 가장 근접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진폭의 크기가 제일 크게 느껴지는 연주는 리히터의 연주가 되겠지만 튜렉의 진폭이 설득력 있게 귓가에 남는 것은 음악의 흐름을 맺고 풀어주는 타이밍이 절묘하기 때문이다. 음이 꺾이는 곳이나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곳에서도 루바토를 계속 사용하면서 진행시키며, 능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능선을 넘는 곳에서 살짝 쉬어가면서 감상자를 흡인시켜 버린다.
튜렉의 평균율은 극도로 느리게 연주되고 있어 긴장감을 유발하는 편은 아니지만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발휘하며 곡에 자연스럽게 당기게 하는 찰기(?)가 있어 지루해지지 않게 된다. 느린 연주이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는 점은 대단하다.
글렌 굴드나 키스자렛 같은 연주자들은 곡의 전체 묶음을 일관된 각도에서 비춰보는 이른바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튜렉은 자신이 원하는 느낌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다. 그래서 곡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인 수준으로 곡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
구조적인 장엄함을 추구하는 리히터의 연주

곡에 내재된 낱낱의 멜로디 라인을 강조하기보다는 크게 보이는 전체적인 화성적인 스트럭쳐를 묘사하면서 화성적인 두꺼운 쌓임과 움직임을 통해서 곡이 지닌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 연주이다. 그리고 낭만주의 시대의 곡을 연주하는 처럼 화려한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다. Book II에서는 다른 연주자에 비해서 좀 더 절제된 면이 있지만 Book I에서는 파격적으로 로맨틱하다. 피아니시모 패시지에서 오른손 핑거링으로 굴려주는 굴러갈 듯한 프레이징의 아름다움은 특기할만하며 트릴의 사용도 기가 막히게 구사한다. 전반적으로 페달링은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음향적으로 흐린 이미지를 만든다. 만일 질풍노도적인 휩쓸림이 필요하다면 리히터의 연주가 제격이다. 바흐의 곡에 적합한 그 이상으로 역동성이 넘치도록 약동하는 연주여서 바흐의 음악이라기보다는 마치 낭만파 음악을 듣는듯한 인상을 주게 한다.
만약 쇼팽이라거나 리스트 같은 낭만주의 시대의 피아니스가 바흐를 연주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다.
타티아나 니콜로예바 연주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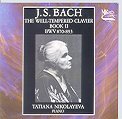
니콜로예바는 러시아의 바흐 스페셜리스라는 명성에 손색이 없는 연주를 들려준다.
로맨티시즘과 템포의 미묘한 변화, 다이내믹을 골고루 갖춘 연주다. 화음의 재현에는 비중을 줄이고 멜로디 라인의 흐름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튜렉의 연주와 멜로디 라인보다는 화음의 중첩으로 견고한 건축물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리히터의 연주 스타일을 평균율 해석의 양쪽 끝단에 있다고 한다면 니콜로예바의 해석은 그 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된다.
니콜로예바는 긴장과 이완을 교묘하게 반복시킴으로써 시청자의 귀를 음악에서 떨어지게 나지 않게 하는 감칠맛을 제공한다. 또한 반복되는 프레이징에서도 그때마다 미묘하게 컬러를 바꾸면서 마치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묘사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든다. 악보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유자적하게 살짝 스피드를 줄였다가 다시 제 템포로 넘어가는 부분은 정말 미묘하지만 그 해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전율을 준다. 곡마다 특성을 살려 살짝 루바토를 구사한다. 그러나 악보를 봤을 때나 그런 것을 의식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티 나지 않게 사용한다. 트릴이나 장식음 주법은 최근의 판에 박은 바흐 스타일보다는 로맨틱하게 구사한다. 그런 면에서는 전형적인 (학구적인) 바흐가 아니다.
그렇지만 부인하기 힘든 것은 대단한 연주라는 점이다.
다음 회에는 에드윈 피셔, 안드라스 쉬프, 프리드리히 굴다, 글렌 굴드, 키스 쟈렛의 연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공연, 연주 감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안 보스트리지 슈베르트 가곡 (0) | 2023.05.01 |
|---|---|
| 좋은 녹음 사례 사이먼 래틀 지휘 베토벤 합창 교향곡 (0) | 2023.05.01 |
| 앱솔루트 사운드 해리 피어슨이 추천하는 Super CD타이틀 (0) | 2023.05.01 |
| 실내악곡이 이렇게 격렬하다고? (0) | 2023.05.01 |
| 베르디 트라비아타 DVD (0) | 2023.04.30 |